티스토리 뷰

오늘 소개해드릴 지상권은 8개의 물권 중 하나이지만
지상권에 대해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죠.
민법 제279조에 지상권의 정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최대한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A라는 땅 위에
B라는 건물, C라는 철탑, D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때 A, B, C, D 모두 한 사람의 소유라면
딱히 복잡할 게 없겠지만
주인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즉, 땅의 주인과 지상의 물건 주인이 다를 경우입니다.
어떤 분은 땅의 주인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며,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땅의 주인과 건물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의 특성상 반드시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땅에 건물을 둔 게 아니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땅의 주인은 아니지만
건물이나 구조물, 나무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주 겪는 일은 아니라
생소할 수밖에 없는 물권이죠.
하지만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결국 땅을 빌리는 거잖아? 그럼 임대랑 똑같은 거 아냐?'
라고 말이죠.
(사실 여기서는 '임대'가 아니라 '임차'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대차를 통해서도 건물이나 구조물, 나무 따위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권과 임대차 계약은 큰 차이점이 있죠.
바로 물권과 채권이라는 차이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물권법 서론 글이었던
'물권이란 무엇인가요?'
https://m.fmkorea.com/3088938306
에서 물권과 채권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지상권과 임대차 계약의 차이점을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땅주인 甲과 나무주인 乙은 토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수목을 심을 목적으로 땅을 빌려줍니다.
甲과 乙 둘 다 만족했고 계약기간도 많이 남아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땅주인 甲의 사업이 망하며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던 甲의 땅이 경매로 팔립니다.
甲의 땅을 산 丙은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이때 나무주인 乙의 입장이 난처하게 됩니다.
나무주인 乙은 새로운 땅주인 丙에게
甲과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자신의 나무가 丙의 땅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丙이 甲의 땅을 샀다고 해서 甲과 乙의 계약에
甲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지 계약과 무관한 丙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간접지배권으로서
특정인에게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아무나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땅주인 丙에게 乙의 나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땅을 차지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죠.
丙은 "그건 당신들끼리 정한 거고, 난 몰라!"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물권'인 지상권은 다릅니다.

땅주인이 甲일 때 乙이 임대차 계약이 아닌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땅주인이 丙으로 바뀌어도 乙의 지상권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물권이니까요.
물권은 직접지배권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핸드폰을 구입하여 소유권(물권)을 얻으면
나에게 핸드폰을 판 사람에게만 핸드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아저씨든, 판사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에게라도 자신의 것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이유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乙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 이용권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甲과 乙끼리 맺은 계약은 채권이니까요.

乙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 이용권을 넘기려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甲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만약 乙이 甲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토지 이용권을 넘겨주면
甲은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乙이 지상권을 얻었다면
아무에게나 자신의 지상권을 넘길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은 권리자 단독으로 지배가 가능한 물권이니까요.

지상권은 말 그대로만 보면 땅[地] 위[上]의 권리이지만
땅 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타인의 토지에' 둔다는 건 땅속에 두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터널은 땅 위에 만드는 건 아니죠.
산을 뚫거나 땅 밑에 만드는 것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전형적인 땅 밑에 만드는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토지 밑에 무언가를 소유할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에도 지상권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토지에 상하의 범위를 두고
지상권을 쓰는 경우를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땅주인이 몇억 원의 지상권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편 지상권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임대든 전세든 남의 집에서 살다가 계약이 만료가 되면
원래대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게 당연한데
지상권도 남의 땅을 쓰다가 계약이 만료된다면
땅을 비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문제는 지상권을 쓸 때의 지상물들은
대부분 옮기기 쉬운 종류의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도 옮기기 어려운데,
건물이나 구조물은 사실상 옮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옮길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라
그곳에 계속 두려고 만드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지상권이 소멸하면 부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법 제285조 제1항에는 토지를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우 낭비적인 방법입니다.
멀쩡한 건물을 지상권이 끝났다는 이유로
다 부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다른 방법도 제시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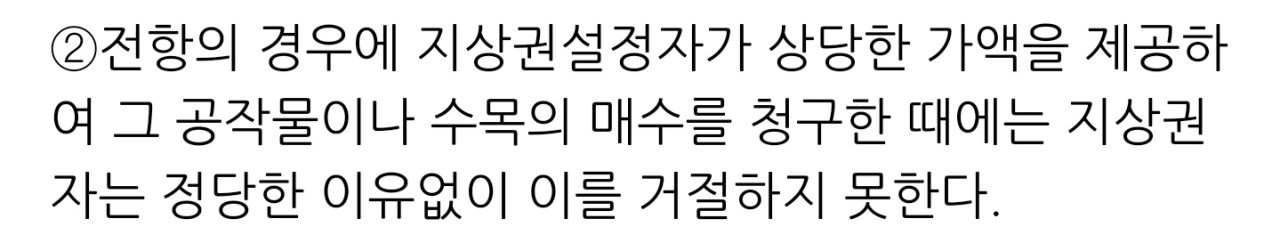
동조의 제2항에 땅주인이 지상물을 사겠다고 하면
지상권자는 팔아야 합니다.
이때 법조문에는 '매수청구권'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청구하는 게 아니라
땅주인의 의사만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상권자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83조를 따르면 지상권이 소멸되면
우선 지상권자가 땅주인에게 지상권 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줍니다.
그러나 땅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땅주인에게 자신의 지상물을 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때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위에서 본 땅주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처럼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으로
지상권자가 팔겠다고 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355 판결)
이렇게 민법은 지상권이 소멸로 인해
건물 및 구조물, 수목을 부수는 낭비적인 상황을 막고자
넣은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위스키의 역사와 종류 (0) | 2021.04.10 |
|---|---|
| 지역권 이란? (0) | 2021.04.09 |
| 근저당과 저당권의 차이 (0) | 2021.04.07 |
| 알아두면 좋은 상식 (0) | 2021.03.31 |
| 1976년 대학교 순위 (0) | 2021.03.26 |
- Total
- Today
- Yesterday
- 호주
- 토렌트 추천
- 과학
- 미국
- 타이완
- 프랑스
- torrent 사이트
- 무삭제
- 무가입 토렌트
- 일본
- 토렌트 사이트
- 영국
- 8.15
- 전쟁
- 한국
- torrent 추천
- 북한
- 주식
- 문제해결
- 토렌트
- 러시아
- 815
- 광복절
- 중국
- 이스라엘
- 대만
- 가입 필요없는 토렌트 사이트
- 문제 해결
- 코로나
- torrent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